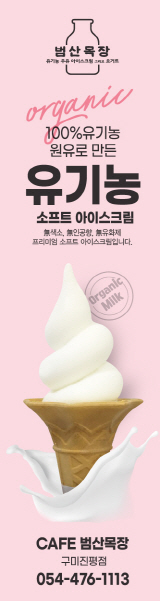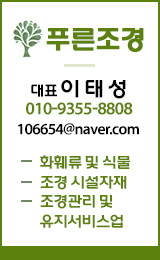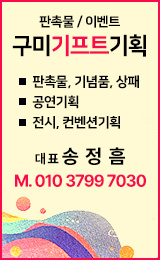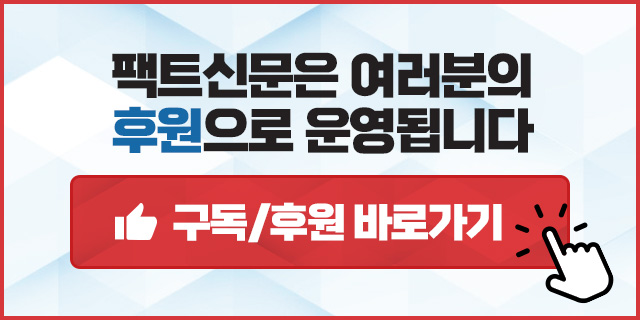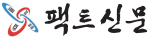[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어느 마을을 가든 얼굴마담처럼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장이다. 원래 이장은 주민들을 대표해 행정기관과 가교 역할을 하는 직책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실세가 되고, 결국 작은 왕국의 군주처럼 자리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기집권을 넘어 세습까지 시도하는 곳도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간단하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이장 선출을 두고 마을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현직 이장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원천 봉쇄한다.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을 동원해 "우리 마을을 위해 오래 봉사한 사람을 내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마을 회비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기본이다. 일부는 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원금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든다. 사업 유치, 농협 지원금, 마을 보조금 등 모든 것이 이장의 손에 달려 있다 보니,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장이 곧 권력이 된다. 공식적인 선출 절차가 있다 해도, 주민들 다수가 그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그냥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마을은 정체되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설령 누군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싶어 한다 해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새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견제가 시작된다. 마을 행사에서 배제하거나, 공사 입찰권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네 사람들끼리 갈등을 조장해 분열시키기도 한다. "쟤가 이장하면 지원금 다 끊긴다"는 식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이장의 장기집권 문제는 한 개인의 권력 욕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마을 발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특정 계층이 혜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든다. 행정기관도 이들과 유착 관계를 맺으며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농촌 지역이 더욱 활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다. 장기집권의 구조를 깨려면 투명한 선출 과정과 견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 뒤에는 새로운 도전자를 배척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농촌의 미래는 과거에 갇힌 채 쇠락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장 한 사람에게 마을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작은 마을에서도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만다.